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의료시설에서 환자복을 입고 걷는 노인의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1] 영화배우 *고(故) 신성일은 생의 마지막 시간을 전남 화순의 한 요양병원에서 보냈다. 지난해 10월 중순 인터뷰를 위해 찾았는데, 마치 경치 좋은 곳에 있는 깔끔한 콘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 여기서 그는 매주 한 번 ‘신성일 영화제’를 열고 자신이 출연한 작품들을 지인들과 함께 감상했다. 경북 영천에 ‘성일가’란 이름의 한옥을 짓고 만년(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시기)의 거처(일정하게 자리를 잡고 사는 일. 또는 그 장소)로 삼았던 은막(극장용으로 쓰이는 스크린)의 대스타.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보름여 후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죽음을 앞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2] 생애 말기로 접어든 어르신이나 환자가 자기가 살던 집에서 임종(죽음을 맞이함)을 맞는 것이 사치일 수도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은 요양시설을 찾는다. 지난해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중 요양원,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 이용자는 13만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1인당 평균 707일(약 1년 11개월)을 시설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좋은 요양시설이라 해도 내 집만큼 편하겠는가. 의료기관에서 말년(일생의 마지막 무렵)을 보내는 기간이 길수록 행복한 임종과는 거리가 멀기 마련이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60.2%는 집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하기를 원하지만, ㉠2017년 국내 사망자 중 14.4%만 집에서 숨졌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원 임종을 맞고 있는 셈이다.
[3] ㉡1991년에는 가정 사망이 75%였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부모님도 상태가 위중해지면 집으로 모셔와 평소 거처하던 방에서 삶의 끝자락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 한 세대 만에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이유는 복합적이다. 쇠약(힘이 쇠하고 약함)한 부모님이나 환자를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가정 간호와 임종을 돕는 사회적 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족이 환자의 통증 관리나 심리적 문제에 의연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 누군가 생업을 포기하거나 개인 간병인을 둬야 할 경우라면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부담이나 고통 따위를 더 크게 하거나 어려운 상태를 심해지게 함)된다.
[4] 살던 곳에서 여생(남은 생애)을 마치고 싶은 것은 대부분 노인들의 간절한 바람이다. 부모 된 마음으로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 마지못해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자식들 역시 어쩔 수 없으니 낯선 곳에서 부모님과 마지막 작별을 하는 것을 받아들일 뿐이다. 병원 사망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임종은 삶의 한 단계가 아니라 의료 문제로 변질됐다. 대개의 한국인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회. 어떻게 하면 죽음이 성큼 다가왔을 때 편안한 환경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작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화두를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다.
동아일보 8월 20일 자 이진구 논설위원 칼럼 정리
※오늘은 동아일보 오피니언 면에 실린 칼럼을 사설 대신 싣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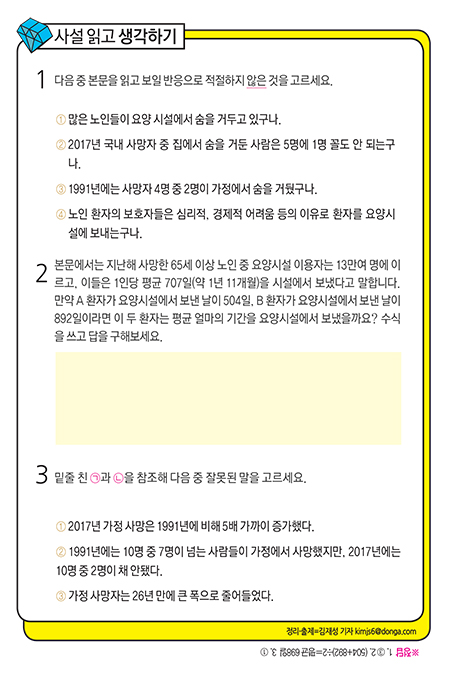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프린트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페이스북 트위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네이버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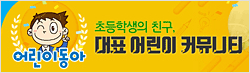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