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엘 ‘카럴 마르턴스: 스틸 무빙’…겹쳐 쓰기의 달인

네덜란드의 그래픽 디자이너 카럴 마르턴스가 자신의 작업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제공
‘사람들이 읽고 버린 신문 위에 겹쳐 그린 그림이 예술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한 작가가 있다. 바로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그래픽 디자이너 카럴 마르턴스(79)다. 마르턴스의 국내 첫 개인전 ‘카럴 마르턴스: 스틸 무빙’이 서울 강남구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에서 내년 1월 20일까지 열린다.
책의 표지나 포스터, 신문이나 잡지의 광고 등에 들어갈 그림과 문구 등을 배치하는 작업을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한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면서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뚜렷해야 훌륭한 그래픽 디자인이 된다. 마르턴스는 간결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그래픽 디자인의 세계에서 다양한 도형과 색깔을 활용해 아름다움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다.
네덜란드의 건축 잡지 '오아서' 시리즈
겹치고 또 겹치고
마르턴스 하면 ‘오아서’를 빼놓을 수 없다. 네덜란드어로 오아시스라는 뜻을 가진 오아서는 1981년 델프트공과대의 건축학부 교수진이 펴낸 건축 분야의 학술 잡지다. 이번 전시에서는 마르턴스가 디자인한 오아서 70여 권을 모두 관람할 수 있다.
마르턴스는 23호부터 이 잡지의 표지와 속지 디자인을 도맡아왔다. 지난 5월에는 ‘카럴 마르턴스’ 특집호인 100호를 발간하기도 했다. 정해진 틀이 없이 매번 내용에 따라 획기적인 표지 디자인을 선보인다는 게 특징이다. 어떤 호는 아예 ‘OASE(오아서)’라는 제호(책·신문의 제목)만 적혀있기도 하다. 겉표지의 색, 글씨체, 글씨의 크기, 그림의 위치 등이 매번 달라져 책의 내용은 이해할 수 없지만 각양각색의 책을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겹쳐 표현하기’는 마르턴스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다. 개중에는 흰 알파벳 글씨 위에 주황색 글씨를 겹쳐 썼기 때문에 어떤 글자인지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 책도 있다. 그래서 멀리서 보기에는 글이 아니라 새로운 도형처럼 보이기도 한다. 100호는 이제껏 마르턴스가 작업해온 모든 책의 목록을 기록한 인쇄물 위에 파란색으로 크게 제목을 찍어내 누가 봐도 마르턴스의 디자인임을 알 수 있게 했다.
여러 도형을 겹쳐 그린 것이 특징인 '모노 프린트' 시리즈
색과 색을 더하면?
‘파란색 도형 위에 노란색을 덧입히면 무슨 색이 될까?’ 마르턴스는 두 가지 이상의 색이 겹쳐 아예 다른 색을 낸다는 사실에 큰 호기심을 느껴 ‘모노프린트’ 시리즈를 작업했다. 그는 색 조합의 기본이 되는 빨강, 노랑, 파랑 중 하나의 색으로 먼저 프린트하고 말린 뒤 그 위에 또 다른 색을 덧입혀 프린트하는 식의 활동에 몰두했다. 그래서 모노프린트 시리즈를 자세히 보면 하나의 도형 같지만 사실은 두 도형이 묘하게 어긋나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마르턴스가 작업한 공공디자인 제품도 이 전시에서 관람할 수 있다. 그는 동전, 전화카드, 우표, 엽서, 편지봉투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제품 디자인에도 적극 참여했다.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 동전은 반 고흐의 이름으로 그의 얼굴을 섬세하게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다. 아쉽게도 네덜란드가 유로화(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의 단일 화폐) 사용 국가이기 때문에 상용화(일상적으로 쓰임)되지는 못했다. 금액이 높아질수록 뒷면에 적힌 숫자가 많아져 한 눈에 카드 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전화카드도 마르턴스의 야심작이다. 매주 월요일 휴관. 입장료 청소년(만 8∼18세) 4000원, 어른 5000원.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프린트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페이스북 트위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네이버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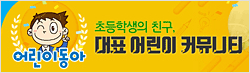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